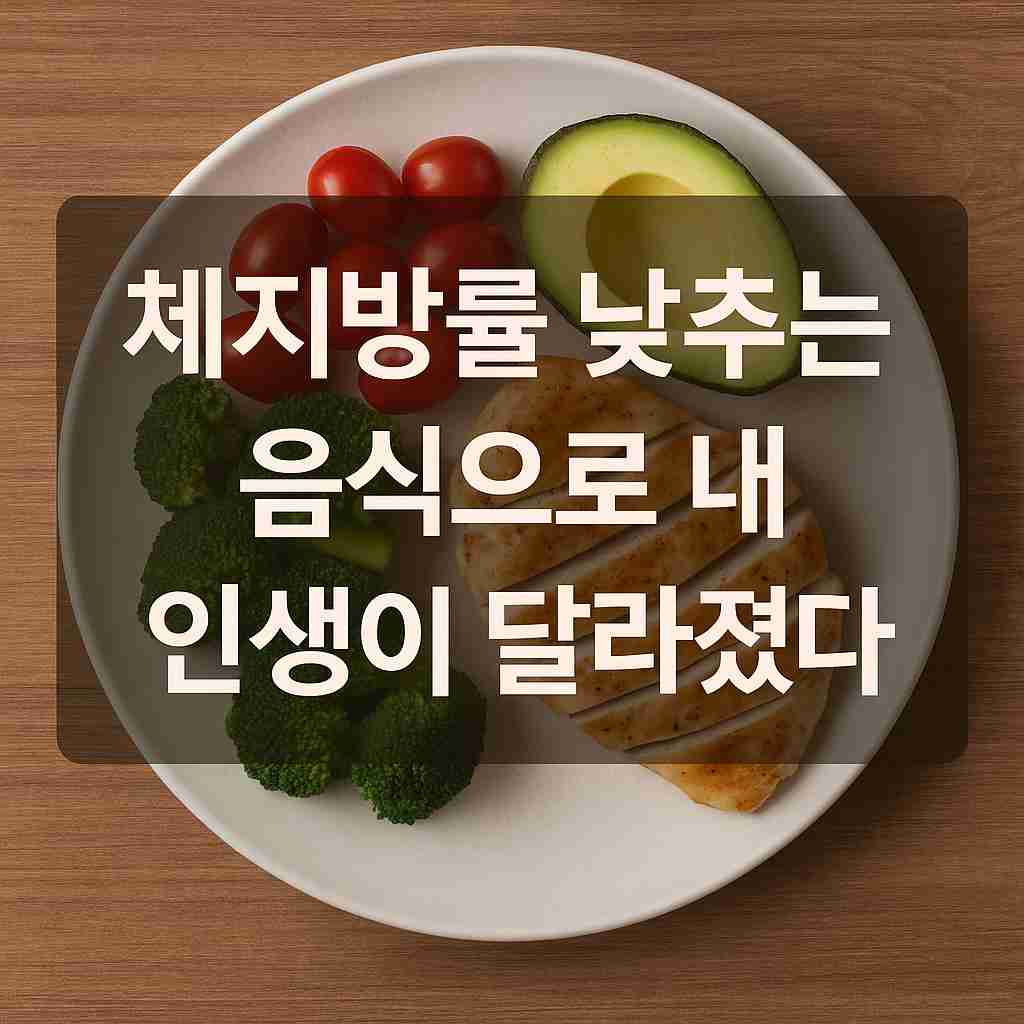숫자 하나에 멈춰섰던 어느 봄날
날이 흐리던 4월의 수요일이었어요.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던 그날 아침,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나는 말문이 막혔죠.
“체지방률 35%”
도저히 나라고 믿기 힘든 숫자였어요. 체중은 몇 킬로 더 나갔다 해도 그러려니 했을 텐데, ‘체지방률’이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다가왔을까요. 거울 속 내가 낯설다는 기분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숫자로 딱 잘라진 현실 앞에 서니까 숨이 턱 막혔어요.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난 매일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도 내 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침엔 아이 도시락 싸느라 허둥대고, 낮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밤엔 남편과 아이 저녁 차려주고 뒷정리하고 나면 이미 하루가 끝나 있죠. 그 와중에 내 몸은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다시 나를 챙기기로 한 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불도 켜지 않은 부엌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옆방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고요.
뭔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닭가슴살만 먹는 건 절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미 예전에 해봤잖아요. 사흘 만에 쓰러질 것처럼 어지럽고, 여섯 번째 날에 폭식하다 울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날은 왠지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번엔 진짜 나를 위해 해보자.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에 제목을 하나 적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도 가벼워지는 방법 찾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다이어트의 출발점이었어요.

첫 번째 변화, 아침부터 다시 시작
예전 아침은 늘 커피 한 잔이 전부였어요. 그나마 아이 등원시키느라 급히 마시고 나가면 점심 전까지 머릿속이 하얘지곤 했죠.
바꾼 건 아주 소소했어요. 일단 계란 두 개를 삶았어요. 계란은 냄새도 맛도 익숙해서 부담이 없었고, 나름 단백질도 많다고 하니 시작하기엔 좋았어요. 거기에 방울토마토 한 줌, 견과류 조금, 블랙커피. 그렇게 아침 식탁이 바뀌었어요.
처음 며칠은 허기가 금방 왔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속이 덜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11시쯤 찾아오던 집중력 저하가 사라졌어요. 그건 꽤 신기한 경험이었죠.
이 작은 변화가 나한테 큰 힘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도시락 하나가 만든 터닝포인트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점심이었어요. 동료들과 같이 먹는 식사 시간은 좋았지만, 대부분이 배달이나 외식이었거든요.
처음엔 같이 먹다가 몰래 밥을 반만 먹고, 나중에 간식도 자제했어요. 그런데도 체지방률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답답했어요. 결국 마음먹고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죠.
처음엔 고구마에 닭가슴살을 넣었어요. 근데 또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계란말이, 두부부침, 버섯볶음, 브로콜리 무침 같은 반찬으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 입맛에 맞으면서도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음식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였죠.
점심 도시락을 제대로 챙겨 먹은 날은 오후 3시쯤 오는 당 떨어짐도 없고, 퇴근 후 폭식 욕구도 덜했어요. 한 끼가 바뀌었을 뿐인데,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물론 매일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아침에 늦잠을 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나가기도 했고,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는 ‘다 소용없다’며 자포자기했던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처럼 ‘역시 난 안 돼’ 하며 다이어트를 접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냥 다음 날 다시 도시락을 쌌고, 다시 계란을 삶았어요.
어쩌면 그런 반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완벽했던 하루’는 없었지만, ‘다시 돌아간 하루’는 수십 번 있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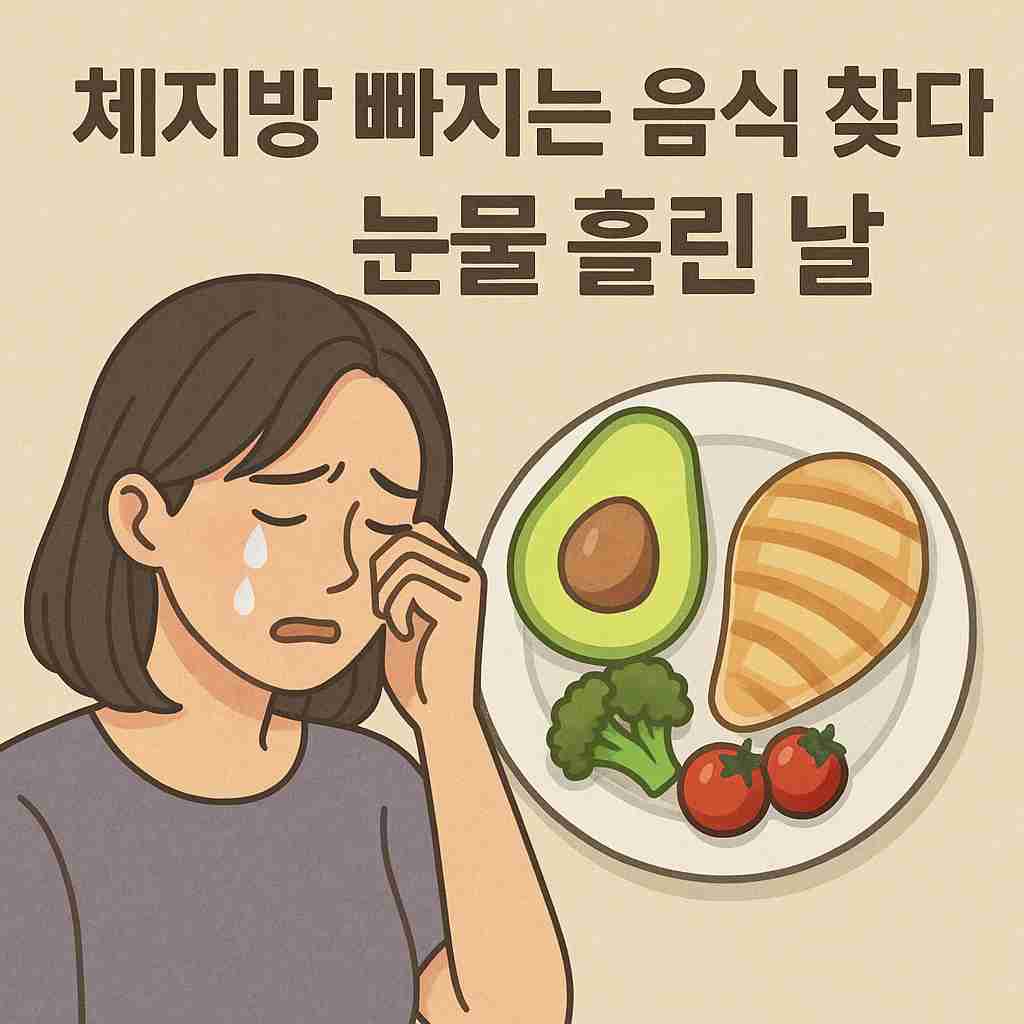
체지방률이 아니라 거울 속 내 모습이 변했다는 느낌
세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체지방률이 29%대로 내려왔다는 걸 알고 기뻤지만, 그보다 더 확 와닿았던 건 거울이었어요.
출근 준비하면서 옷을 입다가 갑자기 옆태를 봤는데, 어깨선이 조금 정리돼 보이고 배가 덜 나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괜히 울컥했어요.
숫자보다 ‘느낌’이 먼저 변했어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표정도 달라졌다는 말을 몇 번 들었고, 그렇게 내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은 식단을 딱 정해두진 않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먹어요. 다만 ‘무엇을 먹으면 나한테 가볍고 편한지’를 기준 삼아서 고르죠.
아침엔 여전히 계란이나 그릭요거트를 챙기고, 점심엔 도시락을 싸가는 날이 많아요. 퇴근 후엔 아이와 산책을 겸한 마트 장보기가 작은 일상 루틴이 되었고요.
회식 날엔 맛있게 먹고, 다음날 조금 가볍게 먹으면 된다는 여유도 생겼어요. 예전 같았으면 폭식 후 자책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내 몸을 믿어요.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나한테 남은 가장 큰 선물
사실 체지방률이 낮아졌다는 건, 내 안에 숨은 근육이 다시 자리를 찾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나를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고, 도시락을 쌀 때면 ‘나 자신에게 작은 응원을 건넨다’는 기분이 들어요.
예전엔 다이어트를 ‘힘든 일’로만 여겼다면, 지금은 ‘살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이어트 시작 후 체지방률 변화
| 주차 | 체지방률 (%) | 변화 느낌 |
|---|---|---|
| 1주차 | 35.0 | 무거운 시작, 불안한 마음 |
| 2주차 | 34.8 | 아주 미세한 변화 |
| 4주차 | 33.2 | 드디어 옷이 헐렁해짐 |
| 6주차 | 31.9 | 식단 루틴이 자리 잡기 시작 |
| 8주차 | 30.2 |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 |
| 12주차 | 28.7 | 바지가 헐렁, 자존감 회복 |
숫자보다 내 감정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 매일 하는 나만의 말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 오늘도 잘하고 있어.”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 됐어요. 육아도, 직장도, 살림도 여전히 벅차지만, 그 속에서 나를 챙길 수 있는 ‘한 끼의 힘’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분명 실수도 하고, 다시 도전도 할 테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이야기가 되어줄 거라 믿어요.
다이어트는 이제 내 몸을 혼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연습이에요.
오늘도 내 식탁 위엔, 작은 변화가 담긴 따뜻한 한 끼가 올라와 있어요.